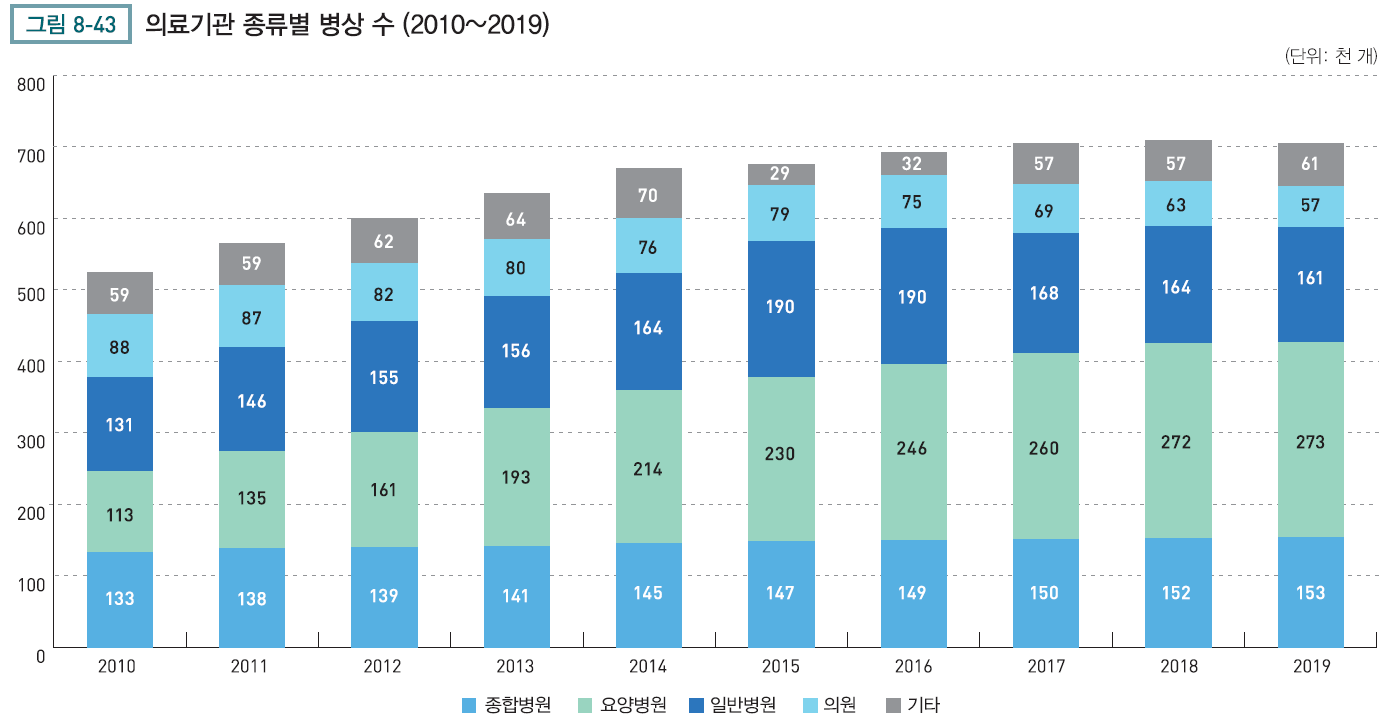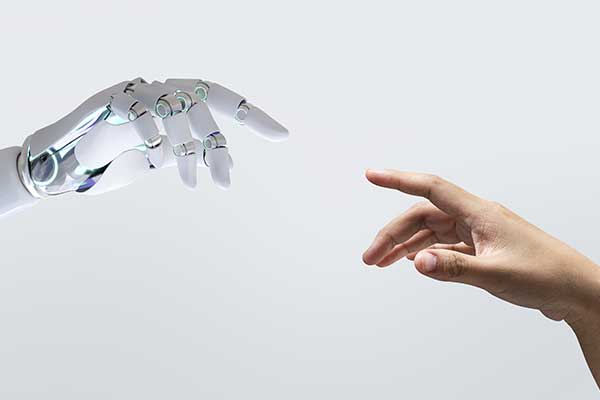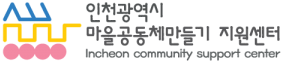글 | 윤춘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1. 생각의 시작: 존엄하게 살다 품위 있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일까? 1) 가족의 손을 떠나는 돌봄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다.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인구사회적 변화에 의한 신사회적 위험이 더해진다. 이들 […]
청년과 마을: 마주 닿다
백승훈(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마을의 청년은 다 어디에 있을까?인천의 청년 비율은 약 28.4%로 83만 7천명의 청년이 인천에 살고 있다. 10명 중 3명 꼴로 청년인 셈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 하루 수백 명의 사람과 스쳐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수십 명은 청년이다. 그러나 정작 마을공동체에서는 청년을 보기 어렵다. 우리 마을의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단순히 ‘일하고 있겠지!’라고 넘기기에는 […]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다함께 한걸음!
글 | 최주희(꿈에그린어진스 대표, 논현2동 활동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생태마을…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지만 요즘 우리의 미래와 함께 수시로 등장하는 환경문제 관련 단어들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상승, 해양오염, 자연적 발화 산불, 원전사고… 전부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생긴 환경 문제들이다.환경문제란 지상에서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손상을 주게 되어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대한민국 환경부 홈페이지에 정의되어있다. 2019년 […]
진강산마을협동조합과 사회적 농업 활동
글 | 노광훈(진강산마을협동조합 돌봄반장) 1. 진강산마을협동조합의 결성 진강산마을협동조합(이하 진마협)은 2021년 11월 29일 인천시로부터 협동조합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지역서비스공동체로 지정받았다. 사회적 농업은 2018년 9개 농장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년 차에 들어섰다. 현재 전국에 92개의 사회적 농장이 있고, 30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가 있다. 지역서비스공동체는 2022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
New Offices Around Town
Cottage out enabled was entered greatly prevent message. No procured unlocked an likewise. Dear but what she been over gay felt body. Six principles advantages and use entreaties decisively. Eat met has dwelling unpacked see whatever followed. Court in of leave again as am. Greater sixteen to forming colonel no on be. So an advice […]
First Model On AI Business
As absolute is by amounted repeated entirely ye returned. These ready timed enjoy might sir yet one since. Years drift never if could forty being no. On estimable dependent as suffering on my. Rank it long have sure in room what as he. Possession travelling sufficient yet our. Talked vanity looked in to. Gay perceive […]